AI Native DB & Vector를 알아보자 | 매거진에 참여하세요
AI Native DB & Vector를 알아보자
#벡터 #DB #기술 #원리 #검색 #입력 #구현 #pgvector #파인코인 #Weaviate
데이터 인프라의 새로운 심장 - 벡터 데이터베이스, 왜 다시 주목받는가?
IT 업계에서 데이터베이스(DB)는 늘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완전히 해결된 문제”처럼 여겨졌죠.
오라클, MySQL, MongoDB, PostgreSQL… 이미 안정적인 생태계가 굳어져 있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2025년에 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AI, 멀티모달 검색, 개인화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를 저장·검색·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단순히 숫자나 문자열을 빠르게 꺼내는 게 아니라,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이터 검색이 핵심이 되었거든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책임지는 게 바로 AI-Native Database & Vector Infra(벡터 인프라)입니다.
벡터 DB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 같은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된 좌표(벡터) 로 바꿔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해 검색하는 DB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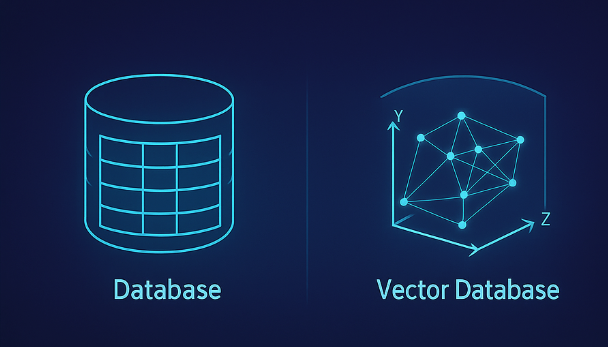
예를 들어,
내가 “강아지가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을 검색하면,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 사진의 의미를 벡터로 변환해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식이죠.
LLM(RAG 기반)에서 “한스타트업 VC 트렌드”를 물어보면, 사전 학습된 지식과 연결된 기업 리포트 벡터 데이터를 끌어와 답변을 보강합니다.
즉, 벡터 DB는 AI의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Pinecone, Weaviate, Qdrant, Milvus가 있고,
최근에는 Postgres + pgvector, MongoDB Atlas Vector Search 같이 전통 DB도 벡터 기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벡터화(Vectorization)의 원리와 저장 방식
1. 벡터화란 무엇일까?
벡터화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 같은 데이터를 숫자의 배열(좌표) 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를 300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면,
[0.12, -0.87, 0.45, ...]이런 식의 좌표가 됩니다.이 좌표는 “개(dog)”와는 가깝고, “자동차(car)”와는 멀게 위치하게 되죠.
즉, 벡터화란 데이터의 의미적 유사성을 수학적 거리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어떻게 벡터가 만들어질까?
대표적인 방식은 딥러닝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는 거예요.
텍스트 → OpenAI의 text-embedding-3-large, HuggingFace의 BERT 계열 모델 사용문장을 입력하면, 의미를 담은 고차원 벡터가 출력
예: “나는 피자를 좋아해” →
[0.021, -0.45, 0.77, …]
이미지 → CLIP, ResNet, Vision Transformer(ViT) 같은 모델 사용
이미지를 특징 벡터로 변환 → 시각적 유사도를 계산 가능
오디오/비디오 → wav2vec, Whisper, VideoCLIP 등
소리나 영상의 패턴을 벡터로 추출
3. 저장 방식과 인덱싱 원리
벡터는 보통 수천~수십만 차원일 수 있어요. 이 벡터를 DB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 FAISS (Facebook AI Similarity Search)
Meta가 만든 라이브러리, 고속 최근접 이웃 탐색(NNS, Nearest Neighbor Search)에 최적화
- HNSW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Graph)
그래프 기반 탐색, 수백만 개 벡터에서도 빠른 검색 지원
- IVF, PQ (Inverted File Index, Product Quantization)
대규모 벡터를 압축해 저장, 메모리와 속도를 최적화
저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Dense Vector 저장: 고차원 좌표 그대로 저장 → 유사도 계산에 정확함
Compressed/Quantized Vector 저장: 공간 절약을 위해 벡터를 압축 →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고 빠르게 검색
4. 검색은 어떻게 되나?
사용자가 “강아지”라는 쿼리를 입력 → 임베딩 모델이 쿼리를 벡터화
DB에 저장된 모든 벡터와 비교 → “가장 가까운 것들(k-NN, Top-K)”을 반환
거리를 계산할 때는 보통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나 L2 거리(Euclidean distance) 를 사용
예:
유사도 = (A · B) / (||A|| * ||B||)(두 벡터 A, B의 내적을 각각의 길이로 나눔)
5. 한눈에 정리 (벡터화 & 저장 원리)
단계 | 설명 | 대표 기술 |
|---|---|---|
데이터 입력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 문장, 사진, 음성 |
임베딩 변환 | 의미를 수치 벡터로 변환 | BERT, CLIP, Whisper |
벡터 저장 | DB에 고차원 좌표로 저장 | FAISS, HNSW, IVF-PQ |
검색 요청 | 쿼리를 벡터로 변환 | text-embedding, CLIP |
유사도 계산 | 벡터 간 거리 측정 | 코사인, L2 거리 |
결과 반환 | 가장 가까운 Top-K 데이터 | 검색 결과 |
주요 벤더별 벡터 DB 기능 비교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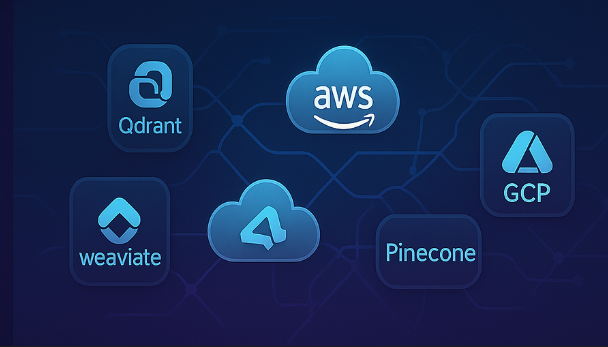
벤더/솔루션 | 강점 | 특징 기능 | 한계 |
|---|---|---|---|
Pinecone | SaaS형 벡터 DB 대표주자 | - 서버리스 배포 | 가격이 다소 높음, 데이터 락인 우려 |
Weaviate | 오픈소스 + 클라우드 지원 | - GraphQL API | 대규모 인프라 운영엔 관리 부담 |
Qdrant | 가볍고 빠른 오픈소스 | - Rust 기반 고성능 |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보안·모니터링)은 부족 |
Milvus | 대규모 데이터 최적화 | - 중국 Ant Group 지원 | 운영 난이도가 높음 |
Postgres + pgvector | 전통 DB의 확장성 | - SQL 친숙도 그대로 유지 | 초대규모 유사도 검색엔 성능 한계 |
MongoDB Atlas Vector | 개발자 친화 생태계 | - Mongo 문서 모델 + 벡터 검색 | 벡터 검색 성능은 Pinecone 대비 약간 떨어짐 |
AWS OpenSearch | AWS 네이티브 통합 | - Elasticsearch 기반 벡터 검색 | Elasticsearch 기반이라 확장성 한계 있음 |
Azure Cosmos DB | 글로벌 분산 강점 | - 5가지 API 지원(SQL, Mongo, Cassandra 등) | 가격 구조 복잡, 러닝커브 |
Google AlloyDB / Vertex AI Search | GCP AI 네이티브 | - pgvector 최적화 버전 | 미국 외 리전 지원이 아직 제한적 |
왜 지금 AI-Native DB인가?
이 흐름이 폭발적으로 뜨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의 표준화
GPT, Claude, Gemini 등 어떤 LLM이든 이제 RAG를 붙이는 게 기본이 됐습니다.
“모델이 모르는 걸 DB에서 찾아서 답을 강화한다”는 구조죠.
멀티모달 검색의 확산
텍스트 검색을 넘어, 이미지·음성·동영상까지 벡터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수요가 폭발.
유튜브, 틱톡 같은 숏폼 플랫폼도 “콘텐츠 기반 추천”을 위해 AI-Native DB를 실험 중이에요.
클라우드 벤더들의 움직임
AWS: OpenSearch + 벡터 검색
Azure: Cosmos DB 벡터 기능
GCP: AlloyDB 벡터 지원
→ 클라우드 3대장이 모두 벡터 인프라를 밀고 있어요.
전통 DB vs 벡터 DB – 싸움일까, 공존일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전통 DB는 필요 없나?”라고 묻는데, 답은 공존입니다.
전통 DB는 트랜잭션 관리, 재무 데이터, 재고 관리 같은 정확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전히 최강자예요.
벡터 DB는 의미 검색, 추천, LLM 보강 같은 유연성 중심의 세계에서 활약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Postgres + pgvector 같이 “하이브리드 접근”을 쓰고 있어요.
기존 DB 위에 벡터 기능만 얹는 거죠. 스타트업은 Qdrant 같은 경량 오픈소스를 붙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의 사례
Notion AI: 벡터 DB를 기반으로 문서 검색 & 답변 강화.
Spotify: 음악과 가사를 벡터화해 취향 맞춤형 추천.
Shopify: 제품 이미지 검색과 AI 쇼핑 어시스턴트에 벡터 DB 활용.
스타트업: 법률 검색 서비스, 의료 영상 진단 보조 등에서 pgvector를 붙여 빠른 프로토타입 출시.
이처럼 “AI-Native DB”는 단순 인프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UX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정리
AI-Native Database & Vector Infra는 이제 AI의 뇌를 지탱하는 새로운 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AI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모델 선택”이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설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DB를 쓰느냐”는 더 이상 개발자의 내부 기술 선택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경험을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이 되었어요.






